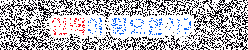2006년 7월 11일 국립민속박물관 주체로 열린 동아시아의 풍수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중국 화남 이공
대학《청지엔쥔(程建軍)》교수가 ‘중국 감주(竷州) 옥척당(玉尺堂)의 풍수이론과 실천에 관한 연구’ 란
논제(論題)에서 우리가 알고 있거나, 접하는 ‘장풍(藏風)과 득수(得水)’ 에 대하여 색다른 이설(異說)을
주장함으로써 당시 토론에 참가한 풍수관련 교수 등과 학인 등에게 상당한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되어
풍수에 목말라하는 학인들에게 그 내용의 일부를 논거(論據)하고자 합니다.
<청쥐엔쥔 교수의 주제 내용>
1. 감주 ‘옥척당’ 에 대하여
중국 풍수하면 강서(江西), 강서 풍수하면 감주(竷州, 중국 강시성의 다른 이름)를 손꼽을 정도로 명청
(明靑) 황실(皇室)의 풍수는 거의 모든 풍수사(風水師)들의 손에 맡겨졌다. 중국의 내노라하는 집안에서
풍수를 볼 때도 감주 풍수사를 청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될 정도로 감주 풍수는 중국 풍수의 대명
사로 굳어졌다. 이것은 아마도 당대(唐代) 황건적이 난을 일으켜 장안(長安)을 장악하자, 국사(國師)이
자 풍수대가였던 양균송(楊筠松, 834~906년)이 궁(宮)의 밀서를 지니고 고향인 강서의 감주로 가서 감
주의 우도(于都), 양선령(楊仙岭) 일대에 풍수를 전파한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감주는 풍수지리가 중요한 직업의 하나가 되었으며 당대(唐代)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옥척경(玉尺經)에 관한 내용… 생략』
2. ‘풍수(風水)’ 의 본 뜻
일반적으로 풍수는 옛날 사람들이 건축물의 터를 정할 때, 기후, 지질, 지모(地貌, 땅의 형상), 생태, 건
강 등 각 건축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과 건축과정에서 배치 기술의 적용과 여러 금기 등을
총체적으로 포함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이 생전에 거주하던 환경과, 죽은 후 매장환경을 선택
하고 처리하던 방법이었다.
건물의 터를 고를 때는 ‘생기(生氣)’ 가 왕성한지, 바람을 잠재우고 기운을 모을 수 있는 장풍취기(藏風
聚氣)를 주로 살폈다. 지관들은 생기를 모으는 모든 요소 속에는 바람과 물의 관계가 가장 크다고 여겼
기에 풍수(風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본 것이다.
옛날 송대(宋代) 사상가인 주희의 고제자(高弟子) 채원정(蔡元定)은 곽박의 장서를 주해(註解)할 때,
「경왈(經曰), 기승풍칙산(氣乘風則山) 계수칙지(界水則止) 고인취지사불산(古人聚之使不散) 행지사유
지(行之使有止) 고위지풍수(故謂之風水)」라 하였다.
여기서 경(經)은 『장서(葬書)』를 가리키는 것으로, ‘기(氣)’ 는 생기(生氣)를, ‘풍(風)’ 은 외부의 기류
(氣流)를 말한다. ‘수(水)’ 는 하천이나 호수처럼 거시적인 의미의 물을 뜻한다. 즉, 생기를 보호하지 않
으면 바람에 흩어져서 그 기운을 모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 생기가 물을 만나면 머물러서 모이게 된
다.
여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채원정이『장서』속의 ‘풍(風)’ 의 개념을 곡해(曲解)하였다는 점
과, 물도 생기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란 점이다.
통상적으로 곽박의 장서 원본을 접하기 어렵고, 청대 대형 유서(類書)였던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
成)』의 예술전(藝術典) 감여부(堪輿部)에 실렸던 곽박의『장서』도 이미 주해를 통해 내용이 바뀌었다
. 이런 오해는 오랫동안 풍수에 대한 사람들의 정확한 관념적 이해를 오도(誤導)해 왔으므로 반드시 근
본부터 뜯어고쳐 원래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1) 바람(風)
곽박 장서 원본은「장자(葬者), 장야(葬也) 승생기야(乘生氣也) 부음양지기(夫陰陽之氣) 희이위풍(噫而
爲風) 위지생기(謂之生氣) 생기행호지중(生氣行乎地中) 발이생호만물(發而生乎萬物)」이라 하여 “매장
(埋葬)이란 숨기는 것이자 생기를 얻는 것이다. 음양(陰陽)의 기운(氣運)이 나와 바람을 형성하니 이를
생기(生氣)라 하며, 생기가 땅 위를 움직이며, 만물이 생겨나게 한다” 라 했다.
곽박이 말하는 생기(生氣)는 지표아래에서 ‘흙(土)’ 의 요소로 대표되는 것으로 ‘지표 위의 만물이 생장
하기 위한 필수요소’ 다. 생기는 바로 흙의 기운(土氣)으로 희이위풍(噫而爲風), 즉, ‘왕성한 생기가 지표
로 흘러나온 뒤에 바람을 형성’ 한다.
여기서 바람(風)이란 흙의 기운, 즉 ??기운이지, 외부 기류인 바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
로, 풍수(風水)의 ‘풍(風)의 본 뜻이다.
(2) 물(水)
곽박의 장서에는「토자(土者) 기지모(氣之母) 유토사유기(有土斯有氣) 기자(氣者) 수지모(水之母) 유기
사유수(有氣斯有水)」라 하여 “흙은 기(氣)의 모체(母體)로, 흙이 있는 곳에 기가 있으며, 기(氣)는 물의
모체로 기가 있는 곳에 물이 있다” 라는 말도 있다.
공기(氣)는 물의 모체이고, 물은 공기를 따라 움직인다. 공기는 ‘물을 만나면 멈추는(界水則止)’ 것이 아
니며, 양자는 밀접한 관계이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풍수의 수(水)는 일반적인 하천(河
川)이나 호수(湖水) 등, 거시적인 물 외에도 생기를 따라 움직이는 물과 생기 속의 물분자(미시적인 물)
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물은 생기를 멈추게 할 수 없으며, 물은 기를 따라 움직인다.
(3) 풍수(風水)
앞서 말한 대로 순수한 풍수의 정확한 개념은 ‘물과 흙(水土)’ 의 개념이다. 실질적으로 지표의 생태와 기
후의 상호관계를 가리키며, 한 지방의 물과 흙이 좋은지 여부, 지표생태와 기후상황이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가 풍수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다. 그 외에도 양호한 경관도 좋은 풍수의 중요
한 조건중의 하나인데, 이 점은 풍수 명저인 옥척경 속에서도 깨달은 바다. 사실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인자요산(仁者樂山) 지자요수(知者樂水)」로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
한다.” 란 말처럼, 경관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로 풍수경관이란 점에 대한 가장 훌륭한 해석이다.
즉, 양호한 생태와 정경이 잘 어우러진 가운데, 좋은 환경 경관의 보살핌 속에서 몸, 눈, 마음을 기르고,
긍국적으로 양생(養生)과 장수(長壽)라는 목적에 다다른다.
『… 이하 생략』
이처럼《정건군》교수의 발표는 우리가 추구하던 풍수(風水)의 본질을 크게 벗어난 내용이 되어 가히
충격적이랄 수 있다.
그는 장서(葬書)의 원본(元本)으로「葬者, 葬也 乘生氣也 夫陰陽之氣 噫而爲風 謂之生氣 生氣行乎地中
發而生乎萬物」이라 소개하면서, 생기는 흙의 기운(土氣)으로 희이위풍(噫而爲風), 즉, ‘왕성한 생기(生
氣)가 지표로부터 흘러나와 바람을 형성’ 한다고 하였다.
또 바람(風)이란 외부에서 기류를 타고 유입되는 바람을 말한 것이 아니고, 흙의 기운, 즉, 땅에서 발생
된 것으로, 이것이 바로, ‘풍수(風水)’ 를 일컫는 ‘풍(風)자가 담고있는 뜻이라 하였다.
또 풍수에서 말하는 ‘수(水)’ 란 일반적인 하천(河川)이나 호수(湖水) 등, 거시적(巨視的)인 물과 함께, 생
기를 따라 움직이는 물과, 생기 속의 물분자(미시적인 물)를 포함한 것으로, ‘물은 풍수가 추구하는 혈
(穴)에서 발생한 생기를 멈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기를 따라 함께 움직인다.’ 고 하
여 지금까지 풍수가 추구하던 장풍(藏風)과 득수(得水)의 개념을 완전히 흔들어 버린 것이다.
즉, 그의 말대로라면 생기가 왕성한 땅에서 바람(內氣)이 생성되고, 물의 역할도 산수(山水)가 화합(和
合)하는 음양상배(陰陽相配)의 개념보다는 기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물이란 것에 의미를 더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풍 수 지 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머리를 북으로 두어야 편히 잠드는 북침시신면 (0) | 2012.09.03 |
|---|---|
| [스크랩] 건강을 부르는 머리 방향 (0) | 2012.09.03 |
| [스크랩] 좋은 땅에서 좋은 기운을 얻는다. (0) | 2012.08.28 |
| [스크랩] 집살때 고려할 7가지 기준 (0) | 2012.08.27 |
| [스크랩] 왕이 태어날 수 있는 명당과 집터 (0) | 2012.08.24 |